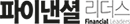(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수민 기자 =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이 전작 <파수꾼>때와의 차별점을 언급했다.
지난 27일 진행했던 <사냥의 시간> 화상인터뷰에서 윤성현 감독은 “개인적으로 제작 과정이 <파수꾼>때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다”라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그는 “다른 단편영화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나는 모두 드라마 장르를 썼다. 사람이 주가 되는 이야기였다. 개인적으로 그런식의 시나리오를 써오다 보니까 반대의 장르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냥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대사에 기대지 않고 시청각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영화다. 그런 영화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오던 게 아니다보니까 예산을 떠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 장르도 장르이고 배경, 미술, 촬영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파수꾼> 때와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감독으로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돌이켜보면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며 회상했다.

실제로 <사냥의 시간>은 윤성현 감독의 첫 장편데뷔작이다. 제작비용으로 약 90억 원 정도 투자되었지만 오히려 <파수꾼> 때는 느끼지 않았던 예산부족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그는 “90억이란 예산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영화를 찍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들은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내면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의 말대로 <사냥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근미래인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처음부터 공간 연출을 위한 미술적 세계관을 구축해야 했고,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인 만큼 방대한 상상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필요했다.
윤 감독은 “촬영할 때 <파수꾼>보다 힘들었다고 하는 건 배경자체가 현실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톤앤무드를 잡는 것부터 미술적 구현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영화가 많이 기획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노하우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방법론을 만들어나갔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IMF라는 미래 상황, 디스토피아적 공간 설정 상 <사냥의 시간> 속 배경은 대부분 버려진 듯한 폐허 공간이다. 촬영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물음에 윤 감독은 “스태프들과 다 같이 찾아나갔다. 모든 장소를 세트로 만들 수 없으니 최대한 로케이션을 살리고자 했다”라며 “폐허는 낙후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너무 낙후된 공간만 찾으면 너무 옛날 시대극처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정한 게 신도시였다. 신도시면서 특이한 구조의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찾았다. 공간을 기반으로 미술 세팅을 하고 그 세팅부터도 오래걸렸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곳들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멀쩡한 신도시의 깔끔한 도로와 도시에서 찍은 것들이다. 그걸 미술적으로 폐허로 만들었고, 거의 사람 키 높이 위로는 대부분 CG작업으로 만들어 낸 거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정체불명의 추격자가 이들의 뒤를 쫓으면서 시작되는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파수꾼>을 통해 각광받던 윤성현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으로 크랭크인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